
화가 유택렬(Yoo Tackyul,劉澤烈,1924~1999)의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부적에서’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40년 이상 정진한 시리즈 작업이다.
“유택렬은 생전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가 유년시절을 보낸 북청은 1851년 추사가 유배되어 1년을 보낸 곳으로 마을 곳곳에, 집안에 추사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전시도록, 경남도립미술관, 2024>”
또 유택렬이 어린 시절 심한 복통으로 '먹물 아바이'로 불리는 노인이 신들린 듯 쓴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고 깨끗이 나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흥미롭게도 ‘부적을 태운 물’은 조선시대 외관 허준이 쓴 ‘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실려 있는 처방전이기도 하다.
북청에서의 이러한 경험과 기억은 유택렬 작품의 샤머니즘적 세계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그는 부적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낼 수 있었다. 유택렬은 1961년에 이미 부적을 소재로 유화 작품을 제작하였고, 선(劃)이 강조된 유화 작업 ‘부적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유택렬은 단청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작품을 1960년대 초에 이미 실험했고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제작하였다. 주로 새와 함께 그려진 단순화한 도형들을 다양한 속도와 리듬의 선과 밝고 화려한 오방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암각화를 소재로 한 작품은 1971년 울산반구대암각화가 발견된 후 70년대 중반부터 제작되었다. 바다와 육지동물을 다양한 선으로 형상화하며 화면을 빼곡하게 채우거나, 암각화의 색과 표면질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0여 년 천착한 일필휘지 ‘부적에서’
1974년부터 한지에 먹으로 일필휘지(一筆揮之)와 같이 단숨에 그려낸 형식의 ‘부적에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여 년간 전개하며 필묵의 맛을 유화로 전환하기 위해 고심한다. 93년 부인의 죽음을 전후로 붉은 배경의 ‘부적에서’가 유화 시리즈로 이어졌는데, 이는 ‘부적에서’가 단순히 부적이나 서체에서 조형성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유택렬의 염원이 담긴 부적 그 자체였음을 강렬히 확인해준다. 그가 평생을 걸어온 화업의 길 끝에는 황색의 ‘부적에서’(1990년 후반)가 미완성으로 남았다.
유택렬의 나이가 60대에 접어든 1980년대 중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때였다. 81년 서울 개인전 이후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꿈꾸며, 안정적인 작업을 이어나갔던 이 시기 그는 작가로서 자기 예술세계의 확장을 위해 ‘부적에서’를 전개해 나가면서도 ‘달과 해’ 그리고 ‘구름과 새’와 같이 자연에서 가져온 모티프와 한국적 이미지를 소재로 작은 소품들을 그렸다.
밝은 톤의 색감과 선이 강조된 표현들, 단순하지만 정겨운 형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유택렬은 환갑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번뇌를 버리고 삶의 여유를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은 더 이상 슬픔과 한탄의 기억이 아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행복과 염원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선(禪)에서 선(線)으로
1990년 초,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한국적 현대 조형의 길이자 예술로 승화한 무아(無我)의 흔적을 위해 유택렬의 예술여정은 다채로운 선(線)의 중첩으로 귀결된다. 예컨대 돌멘(Dolmen), 암각화, 단청, 살(煞), 제(祭), 부적에서 찾아낸 조형적 요소는 한데 어우러져 단순한 선으로 환원된다.
“이어지고 끊어지고, 휘어지고, 흐르며 무한히 반복된 선들은 유택렬의 신체를 통해 기운생동 하는 선, 영적이고 주술적인 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시화하는 선, 업보를 뿌리치는 선. 염원의 선이 된다. 교차하고 축적된 이 ‘한국적 선의 함축’은 그가 말한 선과 조형의 관계성 연구의 종착점이자 그가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일궈낸 ‘한국적 추상’이다.<‘유택렬과 흑백다방 친구들’전시도록, 경남도립미술관, 2024>”

◇1975~1999년 유택렬 주요미술활동
1976년 박생광, 하인두, 정문현, 진의장, 류시원 등과 유택렬은 영토회(領土會)를 결성한다. (전점석-북청사나이 유택렬 연보 2022).
1981년 한국문예진흥원미술회관(서울,7월20~29)에서 ‘유택렬 작품전’을 개최했다. 龍(용)·고인돌·살(煞)·단청·부적·禪(선) 등을 소재로 한국의 근원적 미를 추구한 작품을 엄선하여 화단의 주목을 끌었다. 20년 만에 가지는 5번째 개인전으로 이후 부산, 대구, 마산 4개 도시에서 순회전을 가졌다. 제4회 경상남도 미술대전(7월20~29일,1981)에 초대작가로 참여한다.
1984년 울산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경상남도미술대전(9월25~10월4일)에 초대작가로 참여한다. 86년 경상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87년 3월1일 경남현대작가회를 결성한다. “유택렬은 1987년경에 경남현대작가회를 창립하고 정문현(진주), 유시원(마산), 황원철(함안), 박종갑(창원) 등과 함께 활동하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품할 정도로 열심이었다.(전점석-북청사나이 유택렬, 2022.)”
1988년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한·일 미술교류전(8월30~9월5일)에 참여했다. 89년 부산 타워미술관 및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회 영·호남 원로미술인 초대전에 참여한다. 12월23일 진해를 빛낸 분 감사패와 진해시기념패를 수상했다. 90년 5월2~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에티엔느 드 코장(Etienne de Causans)에서 ‘YOO TACK-YUL’개인전을 개최했다. 파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이다. 9월1일 제6회 시민대상을 수상한다.
1991년 제4회 가야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5월10일 마산 동서화랑에서 ‘유택렬 개인전’을 개최한다. 8월 프랑스 파리 에티엔느 드 코장(Etienne de Causans)에서 ‘YOO TACK-YUL’개인전을 개최한다.
93년 8월 부인 이경승 타계하다. 10월2일 제16회 경상남도 미술대전 경남미술인상 수상하다. 94년 6월 서울 현대아트갤러리에서 ‘파리·서울·도쿄·뉴욕 전’에 참여하다. 99년 3월 진해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제49회 진해미술협회전’에 참여하다. 9월5일 숙환으로 창원병원에서 타계하다. [유택렬 연보 中/자료제공=경남도립미술관]

◇부적 그 평안과 회귀의 영혼
“유택렬 선생에게서 독특하게 다가온 부분이 그 분의 살아온 흔적 중에서 ‘부적’이라는 걸 뗄레야 뗄 수가 없었어요. 유택렬 선생님 일대기 중에서 왜 부적을 그렇게 먼저 접근하게 됐느냐? 다른 그림도 많은데. 자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동네에 먹물 할아버지라고 용한 할아버지인데, 동네 애들이 급체나 배탈이 나면 먹물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를 뭐라고 써서 그걸 불에 사르고 그 재를 먹물에 타가지고 먹이면 배가 금세 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뭘까? 본인은 그게 가장 궁금했을 것이고, 저것은 단순하게 먹물하고 한지를 태운 거하고는 틀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령한 기운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조상이 돕는 영험한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적이 담고 있는 뜻은, 유택렬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안, 돌아가신 영혼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회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산 자의 평안, 돌아가신 영혼의 회귀 그것이 부적하고 통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한 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잡고 써야 돼요. 유택렬 선생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유택렬 선생님의 부적론을 쓰려니까, 참조할 만한 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택렬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그 글을 썼는데, 써 나가는 도중에 유택렬 선생님이 초고를 마치면 전개되는 걸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한 번 봐주고, 응모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였더니 저더러 ‘이만하면 됐어’….<김미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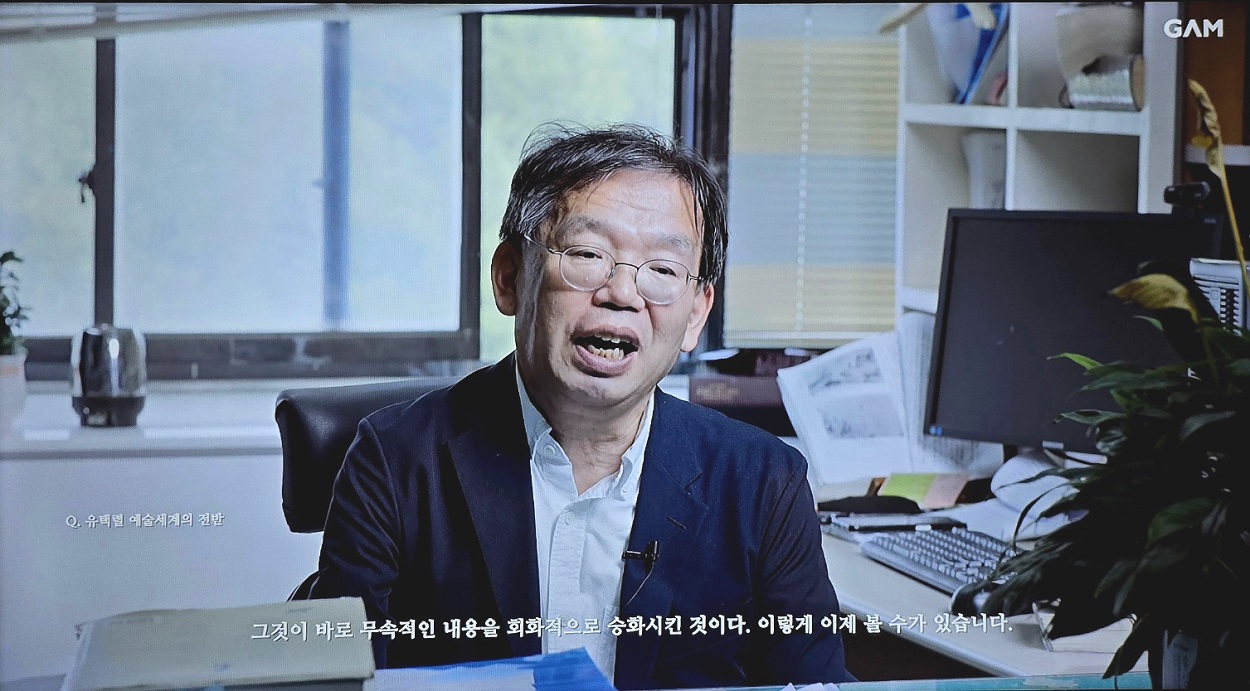
◇“나의 작품은 앵포르멜적이다.”
“유택렬 선생님의 작업세계는 50년대 말의 앵포르멜(Informel) 미술로부터 해서 60년대 초반, 그리고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이 세 시기로 나눕니다.
첫째 시기는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이고, 두 번째 시기의 60년대 중기부터 70년대까지는 대게 옵티컬 아트라든가 팝아트 그리고 미니멀 아트 경향을 띄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주로 ‘부적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한편으로 미니멀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예술세계 핵심 다시 앵포르멜의 행동미술 즉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이라든가 데 쿠닝(Willem de Kooning) 그 다음에 서예적 추상을 통해서 추상미술로 옮겨갔던 그런 앵포르멜적인 작품의 경향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의 작품은 앵포르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80년대의 앵포르멜의 경향, 어떻게 보면 행동미술, 액션 페인팅에 근원을 두고 있는 서체 추상적인 미술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무속적인 내용을 회화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조종식>”
[글=권동철, 1월22일 2025. 인사이트코리아]